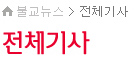출가(出家)는 세속을 떠나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진일보(進一步)이다. 본질적인 면에서 속(俗)의 세계와 성(聖)의 세계가 다를 수 없지만, 사바의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대자유인(大自由人)의 세상에 진입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고타마싯다르타가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고행의 길에 들어선 출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오는 12일 출가재일을 앞두고 출가의 진정한 의미와 그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어나 많은 이야기들을 고전(古典)과 경전, 일화 등을 참고해 살펴보았다.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에서 혜능(慧能)스님은 출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밝혔다. 신출가(身出家)와 심출가(心出家)이다. 신출가는 부모님 슬하를 떠나 세속의 광영(光榮)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심출가는 세속에서의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안정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을 찾는 것이다. 몸만 집을 나섰다고 출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음까지 예토(穢土)의 욕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몸과 마음이 세속을 떠나 진리의 세계에 진입했을 때 ‘진정한 출가’라는 가르침이다.
고려시대 탄문(坦文, 900~975) 스님은 출가할 당시 “뜻은 세간의 진로(塵勞, 번뇌와 같은 의미)를 여의는데 있다”면서 “자취를 치문(緇門, 삭발염의와 같은 뜻)에 의탁하고, 마음을 금계(金界, 불문에 들어서는 것)에 의거할 것을 발원한다”고 사문이 된 이유를 밝혔다. 탄문스님의 모친 또한 “내생(來生)에는 나를 제도해줄 것을 원할 뿐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며 불문에 귀의한 아들을 격려했다. 어찌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 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싶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세속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아가 중생구제의 원(願)을 실천하기를 기원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세속의 행복을 과감히 버리고 출격장부(出格丈夫)의 길에 오른 인물이 적지 않다. 중국 양나라의 초대 황제인 무제(武帝, 464 ~ 549)가 사신(捨身) 공양으로 출가했으며, 신라의 법흥왕(法興王, ? ~ 540) 과 진흥왕(眞興王, 534~576)도 왕업을 성취한 후 출가해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 기메 국립아시아 미술관에는 ‘양무제의 삭발례’라는 벽화가 소장되어 있을 정도로 양무제는 불연이 깊었다. 평생 네 번의 출가를 시도했다고 하며, 그가 치세(治世)할 당시 양나라는 중국 남조(南朝)의 황금기를 이루었다. 양무제의 별칭이 ‘불심천자(佛心天子)’였던 것도 그의 깊은 신심을 엿볼 수 있다. 지금도 불가에 전해오는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은 양무제가 세상을 떠난 황후 치씨를 위해 편찬한 참회문이다. 양무제는 중국에 불법을 전한 달마대사와 인연이 깊었고, 법흥왕은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는 등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도록 공헌했다.
고려시대 <삼국사기>를 집필한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아들 법원(法源)스님 에 대해 쓴 <사자삭발재소(捨子削髮齋疎)>에는 출가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심경을 엿볼 수 있다. 한기문 경북대 사학과 교수의 <고려시대 승려 출가 양상과 사상적 배경>에 인용된 <사자삭발재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랑하던 자식을 떼 내어 저 계단(戒壇)에 바치니, 수염을 깎는 칼을 따라 연운(煙雲,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연기)이 텅 비고 어깨에는 새 가사를 걸쳐서 산수가 환히 드러납니다. … 한 마음의 정결한 정성을 나타내오니, 엎드려 원하옵건대, 인자한 바름을 멀리 퍼뜨리고 지혜의 그늘로 널리 가호하사 … 정각의 몸을 이룩하게 되어 유일한 참된 경계에 노니시며, 나아가선 고해(苦海)에 헤매는 모든 중생까지 함께 자항(慈航, 중생을 자비심으로 구하는 일)에 의지하기를 원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출가를 바라보는 ‘늙은 아비’의 심정을 생생하게 읽을 수 있다. 이규보는 스님이 된 아들이 마침내 정각을 이루어 자유자재의 삶 속에서 중생구제의 길에 나서길 간절히 기원했던 것이다.
원효스님은 “마음의 애착을 여읜 이를 사문이라 이름하고 세속에 끄달리지 않는 것을 출가라 한다(難心中愛 是名沙門 不戀世俗 是名出家)”고 했다. 초기경전에서 ‘출가의 공덕과 이유’를 밝힌 부처님의 육성이다. 동국역경원의 번역을 참고했다. “집에서 사는 것은 비좁고 번거로우며 먼지가 쌓이는 생활이다. 그러나 출가는 넓은 들판이며 번거로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 출가한 것이다. 출가한 다음에는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입으로 저지르는 나쁜 짓도 버리고 아주 깨끗한 생활을 하였다. … 출가했다. 그것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모든 욕망에는 위험이 있으나, 출가는 안온하다는 것을 알아 힘써 정진한다. 내 마음은 다만 이것을 즐기고 있다.”
희로애락 등 ‘고통의 바다’인 현실을 부정하고 ‘집을 나서는 것’이 바로 출가이다. 하지만 출가가 현실 도피의 수단은 아니다. 부처님 제자가 되어 용맹정진해서 얻은 깨달음의 결과를 중생에게 회향할 때 출가의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부처님의 출가재일과 열반재일을 앞두고 돌아본 ‘출가의 정신’은 개인 차원의 깨달음 성취에 머물지 않고, 그 결과를 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에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출가(出家)는 세속을 떠나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진일보(進一步)이다. 본질적인 면에서 속(俗)의 세계와 성(聖)의 세계가 다를 수 없지만, 사바의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대자유인(大自由人)의 세상에 진입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고타마싯다르타가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고행의 길에 들어선 출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오는 12일 출가재일을 앞두고 출가의 진정한 의미와 그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어나 많은 이야기들을 고전(古典)과 경전, 일화 등을 참고해 살펴보았다.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에서 혜능(慧能)스님은 출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밝혔다. 신출가(身出家)와 심출가(心出家)이다. 신출가는 부모님 슬하를 떠나 세속의 광영(光榮)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심출가는 세속에서의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안정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을 찾는 것이다. 몸만 집을 나섰다고 출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음까지 예토(穢土)의 욕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몸과 마음이 세속을 떠나 진리의 세계에 진입했을 때 ‘진정한 출가’라는 가르침이다.
고려시대 탄문(坦文, 900~975) 스님은 출가할 당시 “뜻은 세간의 진로(塵勞, 번뇌와 같은 의미)를 여의는데 있다”면서 “자취를 치문(緇門, 삭발염의와 같은 뜻)에 의탁하고, 마음을 금계(金界, 불문에 들어서는 것)에 의거할 것을 발원한다”고 사문이 된 이유를 밝혔다. 탄문스님의 모친 또한 “내생(來生)에는 나를 제도해줄 것을 원할 뿐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며 불문에 귀의한 아들을 격려했다. 어찌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 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싶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세속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아가 중생구제의 원(願)을 실천하기를 기원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세속의 행복을 과감히 버리고 출격장부(出格丈夫)의 길에 오른 인물이 적지 않다. 중국 양나라의 초대 황제인 무제(武帝, 464 ~ 549)가 사신(捨身) 공양으로 출가했으며, 신라의 법흥왕(法興王, ? ~ 540) 과 진흥왕(眞興王, 534~576)도 왕업을 성취한 후 출가해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 기메 국립아시아 미술관에는 ‘양무제의 삭발례’라는 벽화가 소장되어 있을 정도로 양무제는 불연이 깊었다. 평생 네 번의 출가를 시도했다고 하며, 그가 치세(治世)할 당시 양나라는 중국 남조(南朝)의 황금기를 이루었다. 양무제의 별칭이 ‘불심천자(佛心天子)’였던 것도 그의 깊은 신심을 엿볼 수 있다. 지금도 불가에 전해오는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은 양무제가 세상을 떠난 황후 치씨를 위해 편찬한 참회문이다. 양무제는 중국에 불법을 전한 달마대사와 인연이 깊었고, 법흥왕은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는 등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도록 공헌했다.
고려시대 <삼국사기>를 집필한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아들 법원(法源)스님 에 대해 쓴 <사자삭발재소(捨子削髮齋疎)>에는 출가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심경을 엿볼 수 있다. 한기문 경북대 사학과 교수의 <고려시대 승려 출가 양상과 사상적 배경>에 인용된 <사자삭발재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랑하던 자식을 떼 내어 저 계단(戒壇)에 바치니, 수염을 깎는 칼을 따라 연운(煙雲,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연기)이 텅 비고 어깨에는 새 가사를 걸쳐서 산수가 환히 드러납니다. … 한 마음의 정결한 정성을 나타내오니, 엎드려 원하옵건대, 인자한 바름을 멀리 퍼뜨리고 지혜의 그늘로 널리 가호하사 … 정각의 몸을 이룩하게 되어 유일한 참된 경계에 노니시며, 나아가선 고해(苦海)에 헤매는 모든 중생까지 함께 자항(慈航, 중생을 자비심으로 구하는 일)에 의지하기를 원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출가를 바라보는 ‘늙은 아비’의 심정을 생생하게 읽을 수 있다. 이규보는 스님이 된 아들이 마침내 정각을 이루어 자유자재의 삶 속에서 중생구제의 길에 나서길 간절히 기원했던 것이다.
원효스님은 “마음의 애착을 여읜 이를 사문이라 이름하고 세속에 끄달리지 않는 것을 출가라 한다(難心中愛 是名沙門 不戀世俗 是名出家)”고 했다. 초기경전에서 ‘출가의 공덕과 이유’를 밝힌 부처님의 육성이다. 동국역경원의 번역을 참고했다. “집에서 사는 것은 비좁고 번거로우며 먼지가 쌓이는 생활이다. 그러나 출가는 넓은 들판이며 번거로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 출가한 것이다. 출가한 다음에는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입으로 저지르는 나쁜 짓도 버리고 아주 깨끗한 생활을 하였다. … 출가했다. 그것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모든 욕망에는 위험이 있으나, 출가는 안온하다는 것을 알아 힘써 정진한다. 내 마음은 다만 이것을 즐기고 있다.”
희로애락 등 ‘고통의 바다’인 현실을 부정하고 ‘집을 나서는 것’이 바로 출가이다. 하지만 출가가 현실 도피의 수단은 아니다. 부처님 제자가 되어 용맹정진해서 얻은 깨달음의 결과를 중생에게 회향할 때 출가의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부처님의 출가재일과 열반재일을 앞두고 돌아본 ‘출가의 정신’은 개인 차원의 깨달음 성취에 머물지 않고, 그 결과를 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에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