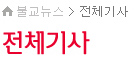입체의 원형은 마음과 돌 속에 잠겨 있었다. 부처님의 입가 미소는 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각가의 마음이 스며나오는 것이었다.
석불상은 돌 속에 잠복된 자비심을 드러내는 석공의 공덕이다. 파고드는 조각과 전통의 정다짐은 그렇게 차이가 컸다.
어색한 웃음과 자연스런 미소간의 대비, 그것은 불교미술대전 대상 작가의 개인전에서 5년만에 다시 확인된다. “흔한 조각상의 웃음은 누르는 듯하지만 우리 석불상의 미소는 웃는듯 마는듯 자연스러움이 가득하다.” 남진세(55) 석공은 조각에 나타나는 억지웃음을 버리고 은근한 웃음을 찾았다.
이번 개인전은 경주석을 전통기법으로 5개월 다듬은 ‘석가모니불’이 초점이다. 그가 경주 남산에서 보고 익혔던 신라 불교의 석불상 미소는 어떻게 재현될까. 그가 고른 돌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부처님 상호를 드러내기 위해 찾아가는 징다짐이 거듭되며, 그의 마음 속에 있던 상호와 돌의 내면 상호가 조우하는 과정이다. 2006년 대상을 받은 연원도 그렇다. 현재 조계종 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석가모니불’이 그렇고, 이번의 ‘석가모니불’도 그렇다.
작품 ‘석련지’도 법주사의 보물 석련지를 2.5배로 축소해 전통기법으로 재현했다. 경주지역의 화강석으로 몸체를 만들고 충북 영동지역 애석으로 난간을 둘렀다. 특히 난간은 돌에 정을 망치로 쳐 다듬는 최소의 규격인 3cm를 고수했다.
징으로 쪼아 만든 선은 강약이 살아있다. 순간 힘이 여러 각도로 부닥치며 선과 굴곡을 이루는 과정이 구도행에 버금간다. 이를 개량된 현대 연장으로 완성하면 느낌이 달라진다. 큰 돌을 현대 기계로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간 후, 전통 징 다짐으로 작품을 완성해도 달랐다. 마무리에서 징 다짐으로 정성을 들인 ‘고행상’ ‘탄생불’은 완벽한 조화미만큼이나 상호에서 전통의 여유로움이 다가오지 않는다. 같은 전시품에 나온 ‘연꽃’은 전체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보이지만, 처음부터 현대 연장으로 완성해 자연미와의 격차가 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13일까지 전시를 통해 이런 대비는 충분한 볼거리이다. 앙증맞고 완벽한 조화미의 ‘농부관음’과 자연미가 살아나는 ‘반가사유상’이 돌조각의 관람법을 안겨주기 충분하다. 새벽을 여는 ‘여전관음’와 지혜와 자비의 ‘성모천왕’간에도 그 대비는 유효하다.
돌조각 40년의 구력을 바탕으로 파고드는 불교세계의 넓은 폭도 볼거리이다. ‘법해존자’ ‘전광존자’ ‘서수’ ‘귀거북’ ‘부엉이 가족’ 등이 전국에 산재한 화강암의 특성까지 곁들이려는 석공장인의 세심한 마음을 전한다.
문화부장 효탄스님은 “각고의 세월을 견디며 정진한 힘이 돌조각에 표현돼 있다”며 “삼라만상의 물상으로 표현된 작품들이 환희심을 자아낸다”고 평가했다.
전통의 석공장인들이 돌을 보고 돌과 이야기 나눴던 족적을 재현하는 작품전을 작가의 ‘미래불’<사진>에서 발길을 멈추게 한다. 미래환생과 중생교화의 불교사상이 옹축된 그의 창작이 날개를 폈다. 전통미가 상호를 7등신 구도로 배분하던 것을 그는 6등신을 금강비율로 적용했다. 얼굴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눈과 코 귀를 지난 입술과 미소가 자신감있게 표출된 배경이다. 그 자신감은 역시 ‘미래불’의 완벽한 조화와 구조이다. 입멸후 다시 사바세계에 출현하여 화림원과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하고 3회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한다는 ‘용화삼회’를 상징하는 미래불은 돌다짐의 조각에서 입체감으로 다가온다. 입체의 원형은 마음과 돌 속에 잠겨 있었다. 부처님의 입가 미소는 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각가의 마음이 스며나오는 것이었다.
석불상은 돌 속에 잠복된 자비심을 드러내는 석공의 공덕이다. 파고드는 조각과 전통의 정다짐은 그렇게 차이가 컸다.
어색한 웃음과 자연스런 미소간의 대비, 그것은 불교미술대전 대상 작가의 개인전에서 5년만에 다시 확인된다. “흔한 조각상의 웃음은 누르는 듯하지만 우리 석불상의 미소는 웃는듯 마는듯 자연스러움이 가득하다.” 남진세(55) 석공은 조각에 나타나는 억지웃음을 버리고 은근한 웃음을 찾았다.
이번 개인전은 경주석을 전통기법으로 5개월 다듬은 ‘석가모니불’이 초점이다. 그가 경주 남산에서 보고 익혔던 신라 불교의 석불상 미소는 어떻게 재현될까. 그가 고른 돌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부처님 상호를 드러내기 위해 찾아가는 징다짐이 거듭되며, 그의 마음 속에 있던 상호와 돌의 내면 상호가 조우하는 과정이다. 2006년 대상을 받은 연원도 그렇다. 현재 조계종 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석가모니불’이 그렇고, 이번의 ‘석가모니불’도 그렇다.
작품 ‘석련지’도 법주사의 보물 석련지를 2.5배로 축소해 전통기법으로 재현했다. 경주지역의 화강석으로 몸체를 만들고 충북 영동지역 애석으로 난간을 둘렀다. 특히 난간은 돌에 정을 망치로 쳐 다듬는 최소의 규격인 3cm를 고수했다.
징으로 쪼아 만든 선은 강약이 살아있다. 순간 힘이 여러 각도로 부닥치며 선과 굴곡을 이루는 과정이 구도행에 버금간다. 이를 개량된 현대 연장으로 완성하면 느낌이 달라진다. 큰 돌을 현대 기계로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간 후, 전통 징 다짐으로 작품을 완성해도 달랐다. 마무리에서 징 다짐으로 정성을 들인 ‘고행상’ ‘탄생불’은 완벽한 조화미만큼이나 상호에서 전통의 여유로움이 다가오지 않는다. 같은 전시품에 나온 ‘연꽃’은 전체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보이지만, 처음부터 현대 연장으로 완성해 자연미와의 격차가 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13일까지 전시를 통해 이런 대비는 충분한 볼거리이다. 앙증맞고 완벽한 조화미의 ‘농부관음’과 자연미가 살아나는 ‘반가사유상’이 돌조각의 관람법을 안겨주기 충분하다. 새벽을 여는 ‘여전관음’와 지혜와 자비의 ‘성모천왕’간에도 그 대비는 유효하다.
돌조각 40년의 구력을 바탕으로 파고드는 불교세계의 넓은 폭도 볼거리이다. ‘법해존자’ ‘전광존자’ ‘서수’ ‘귀거북’ ‘부엉이 가족’ 등이 전국에 산재한 화강암의 특성까지 곁들이려는 석공장인의 세심한 마음을 전한다.
문화부장 효탄스님은 “각고의 세월을 견디며 정진한 힘이 돌조각에 표현돼 있다”며 “삼라만상의 물상으로 표현된 작품들이 환희심을 자아낸다”고 평가했다.
전통의 석공장인들이 돌을 보고 돌과 이야기 나눴던 족적을 재현하는 작품전을 작가의 ‘미래불’<사진>에서 발길을 멈추게 한다. 미래환생과 중생교화의 불교사상이 옹축된 그의 창작이 날개를 폈다. 전통미가 상호를 7등신 구도로 배분하던 것을 그는 6등신을 금강비율로 적용했다. 얼굴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눈과 코 귀를 지난 입술과 미소가 자신감있게 표출된 배경이다. 그 자신감은 역시 ‘미래불’의 완벽한 조화와 구조이다. 입멸후 다시 사바세계에 출현하여 화림원과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하고 3회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한다는 ‘용화삼회’를 상징하는 미래불은 돌다짐의 조각에서 입체감으로 다가온다.
|